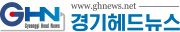▲ 삽화 : 홍봉기 (광양경제신문 편집국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연재소설 - 제 5 화>
나에게는 한 존재가, 자기 속에 50년 넘도록 쌓아 온 크고 작은 막연한 적의와 상처로, 잊히지 않는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장면으로 아직도 생생히 박혀있다.
파도가 섬의 옆구리를 때리고 때려서 만든 절벽의 흔적을 사람들은 절경이라 말한다. 사람도 사람마다의 옆구리에 절벽이 있다. 옆구리의 절벽에 파도가 할퀴고 간 상처의 흔적이 가파를수록 사람에게선 풍란 같은 향기가 난다.
이상하게 그 해 여름, 할머니에게선 풍란 같은 향기가 났다. 쌍커플이 크게 잡혀 눈이 큰 할머니는 겁이 많았다. 시골에 살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쥐와 지네들을 보면 기겁을 하였고 비 오는 날 어김없이 마당에 등장하는 지렁이며 빨간 독 두꺼비랑 구렁이를 보고도 팔짝 뛰었으며 시골에서 자연스레 접하게 되는 모든 벌레들을 경악했다.
번개가 아이들에게 편안해지려면 설명이 친절해야 하듯, 정작 당신은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벌레와 곤충에 대해 유독 설명은 친절하게 해주었다.
“암작에 씰모읎어 보이는 저란 것들도 시상에는 말이다이~ 씨잘 때기 없는 목숨이라는 것은 한 개도 없는 것이여. 긍께 저란 것들도 함부로 막 직이 불고 글먼 안돼 이~. 하이고오 그랴도 저 뭉둥이 같은 것들이 우리 집에는 쫌 안 오먼 쓰것어... ”
할머니는 꽃을 좋아해 마당가장자리에는 채송화를 심었고 정원 한 가운데는 보라색과 노란색의 양란을 비롯해 목련, 백일홍, 연산홍, 작약, 데이지, 사루비아, 맨드라미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꽃 들을 가꿨다. 제일 신경 쓰는 꽃은 담을 껴안고 기다랗게 자빠져 대문 위를 휘감고 있는 붉은 장미였다.
바나나 나무가 있던 우물가 옆으론 지금도 이름을 모르는 하얀 치자 꽃을 닮은 꽃들이 키 재기를 했다.
우물가에 몇 그루의 바나나 나무는 할머니의 치기어리기도 한 우월 섞인 자랑거리였다. 전문가의 손으로 단장하는 큰 정원을 가진 할아버지 친구 황 영감 댁에도 없는 것이 유일하게 바나나 나무였던 것이다. 여름이면 바나나 모양새를 한 열매가 몇 개씩 맺히곤 했지만 끝내 자라지 못하고 개미떼들의 습격으로 골골 앓다 새카맣게 박제한 것처럼 매달려 있다 떨어지곤 했다.
“아, 금메 우리 영감이 나 준다고 쩌어어그 머시냐 제주도까정 뱡기 타고 가 가지고 이고 지고 이 나무를 사와서는이 아, 시상에 여따가 딱 심어 줬당께로. 우리 영감이 말수는 읎어도 소찬히 다정스런디가 있당께~” 하며 집에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던 바나나 나무....
그 자랑하는 마음 안에는 읍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라는 사실보다 내 남편이 살갑게 나를 위해 이런 것도 해준다는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다.
비록 시골에 살았어도 농사가 아닌 건설업을 하던 할아버지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할머니는 다른 아낙들처럼 논과 밭이 아닌 정원에서 매일 호미를 들고 살았다.
가느다란 바람 한 줄기가 퇴행성관절염을 앓듯 절뚝거리며 지나가는 여름 한 낮 오후.
제수 그릇들을 모조리 우물가에 내다놓고 짚세기를 돌돌 말아 연탄재와 양잿물을 섞어 씩씩거리며 할머니는 그릇들을 닦고 있다.
“할무니 또 성 났는갑네? 그릇 닦아 대는거 봉께로”
할머니는 화가 나면 그릇들을, 그것도 제수 놋그릇들을 몽땅 수돗가에 내다 놓고 닦아댔다.
“이 나가 어쩌코롱 흔가 보드라고” 혼잣말로 씩씩 거리며 그릇들을 생선 회 치듯 해치우고 있다. 할머니의 표정 속에는 적재된 빛 속에서 쉴 새 없이 일어서 나뒹구는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조금 있다 큰고모가 흐적흐적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대뜸 할머니의 염장을 지른다.
“엄니, 밖에서 흐는 소리들 들었능가. 아~~따 우리 아부지는 참나 진짜~~~남사시랍게...
아부지가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채렸 다고 아조 난리도 아니드만 엄니는 시방 머든가 ... 나가 어떤 년인지 뒷조사 해가꼬 아조 그년 머리끄댕이를 오독오독 쥐 뜯어 불라마. 엄니는 카만 있어바이. 나가 알아 볼랑께이”
그렇게 큰 고모는 할머니 옆에 잠깐 쪼그리고 앉아 몇 마디 쏟아 부어 놓고는 금새 일어나 총총히 나간다.
수돗가에서 그릇 씻다 말고 큰 딸의 염장 세례에 정신이 바짝 들었는지 할머니는 길게 한숨을 푸우 내쉬더니 탈 탈 털고 일어나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벌컥벌컥 소리 나게 마신 뒤 나머지 물은 마당가에 쫙 뿌리며 “염병흐고... 다들 알아뿐는갑네” 혼자 말을 한다.
수령이 몇 백 년도 훨씬 넘은 팽나무 숲 속에 집이 있었던지라 매일 밤낮으로 온갖 새들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뻐꾸기와 소쩍새가 유난히도 크게 울어대던 그 날 밤.
할머니가 나를 깨운다.
“아이 인나 바라이. 아이 간내야 인나 보랑께”
“으응...할무니 왜애”
“아, 글씨 싸게 인나바. 할미랑 쩌어그 좀 댕기 오게”
“어디?”
“아, 그란디가 있어. 아이고 내 새끼 오늘은 오줌 안 쌌네? 이삔거...싸게싸게 인나바. 할미가 업어줄팅께”
그렇게 나를 들쳐 업고 나선 할머니는 늘어진 문어 다리마냥 흔들거리는 내 다리를 양 팔로 다시 한 번 조여 맨다. 후레쉬를 들고 나서긴 했지만 필요가 없을 만큼 달빛이 밝다.
새카만 짐 무더기가 띄엄띄엄 몇 개 있는 오일장 안으로 한참을 들어가더니 나를 내린다.
할머니는 치마폭 뒤로 나를 감추고 불 켜진 식당을 숨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다.
“할매...왜? 먼 일 인디?”
“쉿, 조용히 흐랑께”
“어? 저 안에 할아부지다”
“쉿, 쉿...”
어린 나이지만 동물적 감각이랄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마치 죽은 오래비가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서늘하고도 싸한 느낌이....
식당인지 술집인지 열려있는 문 안에서 희뿌연 담배연기 사이로 할아버지의 얼굴과 동그랗고 하얀 달덩이 같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인다. 다른 아저씨들도 제법 있었는데 왜 그 날의 모습은 할아버지와 동그란 얼굴의 그 아주머니만 단 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를 일이다.
할머니는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석 달 넘게 할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많이 아팠을 것이다. 외도라고 하기엔 좀 뭐한 구석도 있지만 자기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마주하고 앉아 저렇게 파안대소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심정은 겁 많은 할머니가 감당하기에 버거웠을 것이다.
무서워 밤길조차 혼자 다니지도 못하는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등에 업고 나선 그 길을 그날 밤 어떤 심정으로 걸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끝내 무겁고 어색했으며 슬펐다.
하늘에는 광대무변의 은하수가 보였다. 연약해서 허무한 것과 아득해서 영원한 것의 대비가 선명하다. 그늘 드리워진 심연이 살아 있어서 그 생의 과잉이 저 스스로를 오히려 어둡게 휘덮기까지 하는 별 가득한 하늘을 할머니는 어떻게 보았을까....
그 뒤로도 몇 번을 그렇게 나는 한 밤 중 할머니 등에 업혀 그 집을 다녀왔다. 몇 일간의 잠행 끝에 할머니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다. 어느 날 그 동그란 얼굴의 아주머니를 집으로 불렀다. 나는 할머니가 무식하게 그 아주머니 머리끄댕이 잡으면 어떡하나 내심 조마조마했다.
“우리 집 양반이랑 한 동네에서 컸다고 들었네만...사별흐고 자슥들 건사 흐느라 험한 장사 한다고 들었네. 젓가락 뚜들김서 번 돈으로 자슥들 가리키기 좀 힘들었것는가. 쩌어어그 머시냐 바느질 솜씨가 아조 좋다고들 흐드만 차라리 큰 도시로 가서 한복집이나 양장점을 차리시게. 여 골짜기 시장통에서 대폿집 흐는 것보다야 안 낫것능가. 난중에 자슥들 얼굴보기도 그렇고...”하며 보자기를 하나 건넨다.
“암만 그랴도 지가 어찌 이것을....”
“암말 마시고 이거 받고 여그 뜨시게. 글고 자리 잡으믄 난중에 나 헌티 꼭 연락 한번 흐고...”
그 때는 그랬다. 지금과 달리 1970년 대에는 물장사가 흉이 되기도, 흠이 되기도 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할머니는 그 동그란 얼굴의 아줌마에게 큰 장사 밑천을 대주고 동네에서 우아하게 아예 내쫓아 버림으로써 할아버지의 바람기를 원천 차단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우물가의 바나나 나무도 밑 둥 까지 톱으로 잘라버렸다.
그 날 저녁, 잠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한 마디 하신다.
“어이...고맙네..... 한 동네에서 어렸을 적 같이 컸구만. 불쌍흐게 큰 안디 사정도 딱흐고 해서 갈아 준다고 그라고 다녔네만...이녁이 그라고 속 태우는 줄 몰랐네.... 미안흠세. 가 그라고 도와준거.... 잘했네”
할머니는 조용히 훌쩍 거리기만 했다.
어디 녹물 번지듯 걸어 온 길 위에 비새는 구멍 몇 개쯤 누군들 없겠는가만, 또 어딘가 에선 부서진 인연들이 서로 깨어진 소리를 내기도 하겠지....
인연으로부터 쏟아진 것들이 흙탕물과 합쳐져 살여울을 시작하듯이 시간과 시간을 건너서 가다 보면 좀처럼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생채기도 굳은살처럼 굳어가기도 할 것이다.
그 일 이후로 할머니의 마음에는 굳은살이 생겼을까? 아니면 새살이 돋았을까....
글 : 성미연
삽화 : 홍봉기 (광양경제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