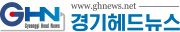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개여울
시인: 김 소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 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 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김소월(본명:김정식)
출생: 1902년~1934년 평안북도 구성
1920년 『창조(創造)』에 시 「낭인(浪人)의 봄」·「야(夜)의 우적(雨滴)」등을 발표하면서 시작(詩作)활동을 시작했다.
작품발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22년 배재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면서 부터인데 주로 『개벽』을 무대로 활약했다.
■ 김소월은 그리움의 회한을 노래하는 우리 시사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그의 시적 출발은 사랑하는 대상의 이별(죽음)이었다고 한다.
겨울을 지나 깨어나는 봄의 이미지. 사랑하는 이의 이별(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텅 빈 얼굴. 시에서 화자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자신에게 되묻는 표현으로 느껴진다. 아주 가지는 않겠다는 약속은 잊지 말라는 부탁이라고 믿게 된 사람의 짙은 외로움이 시에 흐른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그것은 떠나는 사람의 시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남아 있는 사람의 참척 같은 작은 바램이었을까...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남은 자의 탄식이자 기약 없는 소망이었음을....
굳이 잊지 말라고 떠난 이가 내게 한 부탁인 듯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 슬픔은 쓸쓸하면서도 애잔하다.
푸른 꽃 지고 개여울에 서리 앉는 계절이 오면 찬 공기 안에 뜨거운 입김을 서럽게 서럽게 토해내듯 묻고 싶지 않았을까....
만 20세인 1922년 발표한 개여울은 당신이 앉아있던 과거의 개여울과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개여울을 대비시킨다.
19세에 시를 쓰기 시작해 백여 편이 넘는 작품을 남기고 33세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김소월 시인. 나라를 빼앗긴 시절에 살다 간 위대한 민족 시인으로서, 켜켜이 쌓인 슬픔에 어찌하지 못하는 젊은 청년의 잔잔하고 조용히 슬픔을 내뱉는 시는 울림이 강하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20년대 누군가와 헤어지고 재회를 약속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시절이다. 지금이야 지구 반대편에서도 휴대폰 메시지로 얼마든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때는 그렇지 못했다.
누군가가 길을 떠난다는 건 긴 단절을 의미했을 것이다. 당신이 소식을 보내오기 전까지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당신과 나란히 앉았던 개여울에 나가 앉아 당신이 남긴 몇 마디의 약속을 반추하는 것 밖에는...
그 와의 약속이 하루하루를 잡아 당겨보면 내부가 자명해지는 서랍처럼 얼굴과 마음에 그늘을 만들었으리라.
스무살의 김소월은 사랑과 이별에 대해 삶의 안타까움과 방황 그리고 슬픔에 대해 이렇게나 절절하게 표현했다.
형광등이 심약한 증인처럼 한 번 깜빡이는 순간,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들의 사랑과 이별은 이복자매일 것이라고.....
감히 사랑을, 아픔을 아는 척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