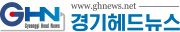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연재소설 - 제 1 화>
차멀미할 때 미식미식 하다가 별안간 토악질이 치미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는 기억 한 조각이 불쑥 떠오른 건 그 때 우리 마을에서 사라진 옥자의 소문을 들었던 그 날처럼 스산하게 비가 와서일까....
70~80년대 시골 마을에는 동네 꼬맹이들도 다 아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미친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었다. 그 때는 그랬다. 의료시설도 보호시설도 없었던 시절이라...우리 마을에도 어른도 아이도 아닌 옥자라는 미친 여자와 개팽이라는 미친 아저씨가 있었다.
사계절 내내 거북이 등짝 같은 새까만 발등을 드러내 놓은 채 늘 맨발로 돌아다니던 옥자는 오늘처럼 부실부실 비가 내리는 날엔 어김없이 오일장과 버스정거장으로 뿌리 채 뽑아 흙이 달랑달랑 매달린 꽃 들을 한 웅큼 손에 쥐고 헤죽헤죽 웃으며 뛰어 다녔다.
수세미 같은 머리에 벌건 양 볼은 항상 거미줄처럼 터져 있었고 푸대자루 같은 원피스는 끈이 한 개밖에 없어 대각선으로 한쪽에만 걸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아무데서나 항상 속옷을 안 입고 다녔기에 편하게 큰 길에 앉아 볼 일을 봤다.
그러면 동네 꼬마들이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옥자를 괴롭혔다. 어른이건 아이건 할 거 없이 옥자한테 “함 보이조봐”하면 옥자는 헤벌쭉 웃으며 치마를 훌러덩 까뒤집고 자신의 은밀한 음부도 보여주었고 호빵처럼 말랑말랑해 보이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젖가슴도 훌렁 까서 보여주곤 했다.
개팽이 아저씨는 월남전쟁에 참전했다가 머리가 돌아버렸다고 했다. 초록색 새마을운동모자에 소매 깃과 카라 깃이 닳을 대로 닳아 빠진 낡고 허름한 야상군복 차림으로 목에는 늘 상 누렇게 바랜 휘파람(호루라기)을 걸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항상 열심히 정열을 맞췄다.
귀가 째질 듯 세게 휘파람을 불어 대며 버스 정거장에서, 시장에서, 서커스단 천막 입구 앞에서....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허리춤에 어떤 날엔 노란색의 또 어떤 날엔 파란색의 나일론 끈을 허리띠처럼 묶고 줄을 기다랗게 질~질~끌고 다녔다는 점이다.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 집에다 묶어 놓은걸 노상 풀고 나왔으리라.
과부 마음 홀아비가 알아준다고 동네 아이들이 돌을 집어 던지며 옥자를 괴롭히면 어디선가 개팽이 아저씨가 휘파람을 불면서 나타나 아이들을 쫓아내며 혼내주니 옥자에겐 가족보다 더 든든한 보호자였을 것이다.
혼쭐이 나 도망가면서도 아이들은 손나발을 해가며 “얼레리 꼴레리~서방각시래요~”하며 놀림을 그치지 않았다.
개학을 삼일 정도 앞둔 여름방학 때 밀린 일기와 방학 숙제를 벼락치기로 할 계획을 가지고 창숙이 집에 친구 세 명이 모였다. 마침 창숙이네 고양이 나비가 새끼를 다섯 마리나 낳아 숙제는 뒷전이고 새끼 고양이들하고 놀면서 옥수수를 생쥐처럼 파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양은 세숫대야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구신은 머든가 몰라~
야곰~야곰 등골 빼 먹는 니 오래비나 남사스런 저 염병할 년이나 좀 잡아 가제는.
저거 저거 그걸 시방 쌩으로 쳐 묵으믄 으짜냐 썩을 것아~아적 익지도 안 했꾸만 이년아 아이고오~ 나 가 못 산당께~”
“아이 금자야~ 니 언니 깨깟이 잠 씻겨라이. 저 년 또 똥 싸 가꼬 쳐 뭉개 앉았었던 갑네이”
툇마루에 배 깔고 누워 있었던 우리들은 야트막한 담장 너머로 대차게 속사포처럼 날아오는 욕들을 생중계로 들었다. 뭔 일인가 싶어 똥그란 눈으로 창숙이를 쳐다보니 마지못해
"이~ 실은....우리 옆집에 그 미친년 옥자가 살잖애~”
이렇게 누구나가 옥자 이름 앞에 미친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말했다. 다들 그러하니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나가이 실은 미친년 옥자랑이 옆집 산 다는 거시이 챙피해서이 아무 헌티도 말 안 했써야”
“그거시 뭐 어째서야 니 잘못도 아닌디. 우린 암시랑 안해”
“이 우리도 아무 헌티 말 안 할끙께 걱정 흐지마야. 니가 이라고 싫어 흔디...”
그렇게 비밀을 공유하게 된 우리는 그것이 뭔 대단한 비밀이라고 그 날 이후로 삼총사가 됐다.
그렇게 알게 된 옥자네 가족사는 이랬다. 옥자 아빠는 3년 전에 병으로 죽고 큰 오빠는 광주에서 건달생활하고 옥자가 큰 딸인데 밑으로는 동생들이 줄줄이 네 명이나 더 있었다. 자기도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지만 친구 엄마 이야기로는 아마 옥자가 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2~3학년 쯤 됐을 거라고 했다.
방학이 끝난 후, 세 차례의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나가고 여름과 가을의 중간 쯤 인 어중간한 계절에 스산한 비가 며칠씩 퍼붓던 토요일 오후. 창숙이가 비밀스럽게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있잖애~ 미친년 옥자 불쌍해서 으짜쓰까이~”
“왜애~”
“이~ 아, 그거시...이거 진짜 비밀이어이~”
이렇게 신신다짐을 받고 나서야 말한다.
“옥자를 세상에 지 엄니가 팔아 뿌럿대~”
“으메으메 뭔 소리래~”
“음마 오살맞아라이~”
“아~글고 봉께 요새 통~ 안 보인다 싶드라”
“약 맹그는 회산가에서 실험용으로 세상에 옥자 언니를 사갔대”
처음으로 창숙이가 옥자를 언니라 불렀다.
“그래가꼬이 그 집 요새 아조 살 판 났는갑써~ 돈을 많이 받았는가 어쨌는가 아조 툭 하면 짜장면 시키 묵더랑께~”
“오메오메오메 쑹악시러운거~”
“긍께로~”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은 금방 퍼졌다. 대개가 옥자 엄마 험담이었다. 서방 잡아먹은 년이 자식까정 잡아먹었다는 둥 인겁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을 팔아 먹느냐는 둥....
옥자에 대해서도 말이 무성했다. 친구한테 들은 대로 약 만드는 회사에 팔려 갔다는 둥, 병원에 실험용으로 팔려 갔다는 둥, 마루타가 되어 오질라게 고문 당하다 죽었다는 둥...일제시대도, 독립투사도 아닌데... 이렇게 헛헛한 소문이 무성하게 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더러 일어나기도 하는 게 그 때 그 시절이었다.
옥자네 식구들은 결국, 소문에 시달리다 짐을 싸서 부산으로 이사를 갔다.
한 동안 개팽이 아저씨만 비 오는 날 휘파람을 불며 양팔을 휘 휘 휘젓고 돌아 다녔는데 그 모습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막걸리에다 농약을 타서 마시고 죽었다고 했다.
몸에 종기가 나 본 사람은 알 수 있다. 곪은 종기 보다 빠알갛게 부어오른 주위 살들이 더 예민하게 성나 아프다는 걸...
정신이 온전치 못한 피붙이 하나로 온 식구가 쑥덕거림과 놀림을 처절하게 다 받아내야만 했던 그 아픔과 억울함에 대해 우리 모두는 방관만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어리다고 다 용서 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 때는 나도 친구들도 채 열 살이 안 된 겨우 초등학교 2학년의 가시내들 이었다. 가을비의 비린내가 코끝을 자극하는 오늘, 지금에라도 그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그 때의 나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다.
놀려서, 도와주지 않아서 미안했다고...
그나저나....그 때 옥자는 정말 어디로 갔을까? 진짜 팔려 간 걸까?
사십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것이 궁금하다.
글 : 성미연
삽화 : 홍봉기(광양경제신문 편집국장)